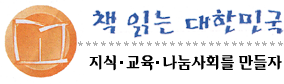
Ⅳ 독서현장탐방
8. ‘책 읽는 의사, 의사들의 책’
 |
| ‘청년의사’가 올초부터 ‘책 읽는 의사, 의사들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책읽기 캠페인 포스터가 서울 강북삼성병원 의학정보실의 한 벽면에 붙어 있다. /서성일기자 |
내가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 다른 학생들에 비하면 덜 자주 가기는 했지만, 의학도서관이라는 곳을 자주 찾았다. 중앙도서관까지 가는 약간의
시간까지 아껴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니고, 그저 그곳에 좌석 여유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머리를 식힌다는 구실로 가끔씩 서가를 둘러보며 ‘책 구경’을 하곤 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늘 불만을 느껴야 했다. 구경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의학도서관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책과 잡지(물론 의학 학술지가 대부분이다)가 있지만, 의학서적 이외의 책들, 가령
소설책이나 인문사회 분야 책들은 별로 없었다. 그런 책들은 구석에 있는 서가 두어 개에 ‘구색’을 맞추는 정도로만 꽂혀 있는데, 그마저도 죄다
오래된 책들뿐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무리 의학도서관이지만 명색이 도서관인데, 다른 분야의 책들이 너무 없지 않은가. 우리 학교 의학도서관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라고.
#의학도서관에 양서 비치하기
그런데 졸업 몇년 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다. 우리나라에 있는 의학도서관들 상당수가 의학서적 외의 책은 단 한권도 소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특화된 전문 도서관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적어도 대학에 있는 도서관이라면 최소한의 양서는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탐구하고 치료한다는 의사나 예비의사들이라면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에
대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의학지식이 어디 있으며,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중 독서만큼 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삭막하기
그지없는 의학도서관의 그 풍경이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인간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이후 몇년 동안 ‘의학도서관에 양서 비치하기’는 나의 작은 꿈이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 청년의사’라는 이름의 의료전문
주간지를 만든다. 의료계 안에서는 꽤 유명한 매체인데, 나는 어느 날 그 ‘브랜드’를 활용하여 내 꿈을 실현시킬 방법을 떠올렸다. 당장 기획안을
쓰기 시작했다.
#전국 65개 의학도서관에 추천도서 지원
의학도서관에 정기적으로 좋은 책을 기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분기별로 추천도서를 다섯 권쯤 선정하여 책을 보내고 독후감도 공모하고
포스터도 붙이자,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 좋은 독후감을 쓴 사람에게는 소액이라도 상금을 주자, 상금은 현금으로 주지 말고 ‘책만’ 구입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주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재원마련이었다.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니 필경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아야 할 텐데, 비록 공익성은 있다고 하지만 마케팅 효과가 불분명한 이런 사업을 위해 선뜻 거금을 투자할 회사가 있을까? 전국의 주요 병원과 의과대학에 포스터를 부착한다거나, 후원사의 이름을 딴 별도의 서가를 의학도서관들에 만든다거나, 우수 독후감으로 선정된 글들을 ‘청년의사’ 지면을 통해 매주 소개하면서 후원사를 명기한다는 등의 ‘미끼’를 마련했지만, 많은 회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청년의사’가 분기별로 선정한 추천도서 중 일부
우여곡절 끝에 이 프로젝트는 성사됐다. 문학과 음악을 좋아하는 한 최고경영자(CEO)의 결단 덕분이었다. 제약회사 한국GSK의 김진호
사장이신데, 그분은 어느 식사자리에서 나의 설명을 듣자마자 ‘멋진 생각’이라며 후원을 약속했다. 앞에서 소개한 모든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실현되어, 지금 현재는 분기마다 다섯 권씩의 추천도서를 각각 두 권씩 전국의 의학도서관에 기증하는 한편, 모든 의사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독후감
공모도 실시하고 있다. 의료계와 문화계 인사 다섯 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활동 중이고(추천도서의 다양성을 위해 매년 바꾸기로 했다), 전국에
있는 65개 의학도서관에 마련된 ‘GSK Library’라는 이름의 서가에 정기적으로 책이 쌓이고 있다.
#의료계의 ‘느낌표’
지금 네 번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까지 우리는 20 종류의 다양한 양서들을 65개 도서관마다 각각 40권씩, 총 2,600권을
보냈다. 추천도서들은 문학, 인문, 사회, 자연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목록은 www.fromdoctor.com에서 보실 수
있다).
물론 1년 만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책 읽는 의사, 의사들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캠페인의 영향은 적지 않은
듯하다. 응모되는 독후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 캠페인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읽는 의료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학생 수가 많은 몇몇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책들이 모두 대출되어 읽기가 어려우니 좀더 많은 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나는 ‘사서 읽으세요’라고 대답한다).
분기마다 추천되는 다섯 권 중에서 적어도 한권씩은 읽기로 결심했다는 사람, 추천도서 모두를 읽기로 결심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번 독후감을
보내오는 사람도 있다. 이제 슬슬 ‘우리 책을 추천도서 목록에 올려달라’는 출판사들의 청탁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의료계의 ‘느낌표’가 되었다고
할까.
이 캠페인과 관련하여 나는 많은 e메일을 받았다. ‘좋은 일 한다’는 의대 교수님들의 격려편지도 있었고 ‘덕분에 책값 지출이 늘었다’고
불평(?)하는 개원의의 편지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학생들이 보내는 편지다.
“교과서 말고 다른 책 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의대 문화를 바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생각했다.
‘아,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긴 했구나.’
박재영 의사·‘청년의사’ 편집주간